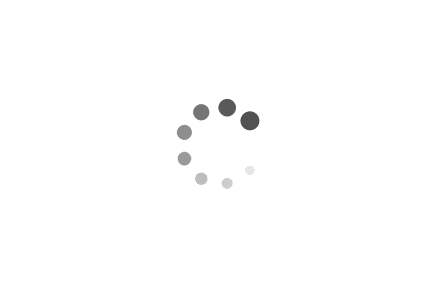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장면부통령저격사건 논고요지 발표
장면부통령저격사건이 재수사되자 피고인들은 예상한 것처럼 관련사실을 극구 부인하였다. 피고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임흥순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은 모두 경찰에서 뼈가 자란 자들로 이익흥이 27년·장영복이 30년·박사일이 24년·오충환이 23년을 경찰관으로 복무한 것이다. 이들은 범인심리에 능통하여 본 건에 있어서도 연관성을 부인하고 중요한 증거는 인멸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일부가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르고 특히 사형확정수 최훈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최훈은 사건이 발생했던 5년 전부터 일관되게 이덕신·오충환·박사일·장영복·김종원·이익흥(당시 임흥순도 지적했으나 기록에서 말소됨)등이 배후에 있다고 진술했으나 이승만정권 하에서 묵살되었던 것이다
본 건 수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최훈의 진술이다. 피고 오충환이 김종원에게 시경옥상에서 최훈을 떨어뜨려 사망하게 하자고 제의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더라도 최훈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배후를 자백했던 것이다. 반면 이덕신의 경우는 그가 사형확정수이므로 자백을 해도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일밖에 안 되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최훈의 진술만으로도 피고들의 죄가 충분히 인정되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해 최훈의 진술의 진실성을 보이고자 한다
제2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생략)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 오충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피고 등의 진술의 모순성은 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김종원은 사건관련을 부인하며 오충환이 최훈과 김상붕을 시경옥상에서 떨어뜨리자고 하자 본인이 제지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종원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오충환이 상관인 치안국장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살인극을 꾸미자고 제의하겠는가? 또 임흥순은 김종원과 만난 일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시장실에서 둘이 만난 것을 당시 부시장 최응복이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제3 법률적용
본 건은 공모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이다. 이유는 동일한 자리에 합석하여 모의하는 것만이 공동모의가 아니고 그 중 한명을 개입시켜 모의하고 심지어 상호안면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모의가 성립되는 것이 일관된 판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건을 실행한 김상붕이 살인미수이므로 피고인들은 살인미수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형법 제254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제4 결론
피고인들은 지금도 완강히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고 하수인인 사형확정수 이덕신·최훈·김상붕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인면수심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일국의 부통령을 살해하고자 한 것만도 용서할 여지가 없는 행위인데 계속 죄과를 은폐하려는 자들은 극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 분류
- 과거사 진상규명운동 1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