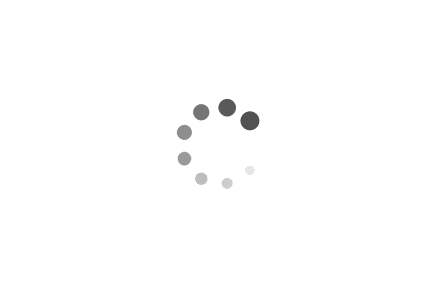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빛고을이 내게 말한다
“역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양쪽 강가를 모두 관찰하고 그리고 양쪽에 다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영화의 원작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다소 의외로 여겨질 것인가? 원작자인 베른하르트 슐링크 교수는 원래 헌법학자다. 그는 그 책에서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삶의 현실로 합치되는 모습을 그렸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지금의 내가 어찌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궤적에 무관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봄꽃들이 지천이다.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던 신동엽 시인의 소망은 여전히 미완이고 현재진행형이다. 그는 우리의 현재인 그의 미래를 이미 예감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썼다. “미치고 싶었다. 사월이 오면 산천은 껍질을 찢고 속잎은 돋아나는데 사월이 오면 내 가슴에도 속잎은 돋아나고 있는데, 강산을 덮어 화려한 진달래는 피어나고 있는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사월은 갈아엎는 달 그날이 오기까지는 사월은 일어서는 달...” 시인의 말처럼 사월은 왔으되 완연한 봄은 아직도 멀게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 춘래불사춘이 어느 때보다 실감나는 시절이다. 목련 지고 진달래가 산자락을 수줍게 덮더니 벚꽃은 봄바람에 화려한 풍장(風葬)을 당한다. 이윽고 라일락 향기가 천지를 희롱하니, 어느덧 오월이 코앞이다. 오월은 숙성한 여인네의 모습으로 다가 오지만,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오월과는 더 이상 음풍농월할 수가 없다.
광주 학살에 대한 기억 때문이리라.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가 독일군의 계략으로 폭탄을 투하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된 지역으로 후일 피카소가 작품으로 남겨 우리의 가슴마저도 아프게 후벼 팠던 게로니카. 게로니카의 한국이름은 광주일 것이다. 빛 고을이 피의 전장터로 변한 곳. 나의 영원한 부채(負債). 내 인식의 지평에 뜬 또 하나의 거대한 행성. 그리하여 나의 청춘을 그토록 괴롭히던 원죄와도 같은 존재. 광주는 지금도 여전히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른다.
1981년 봄, 조국에서의 참상이 날것으로 가슴에 각인된 채 독일의 작은 대학도시 튀빙겐에 둥지를 튼 내게 친구는 몇 장의 유인물을 내밀었다. 광주학살을 TV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접했던 튀빙겐 대학의 한인유학생들이 모여 작성한 성명서였다.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내려간 장문의 유려한 문장은 사변적이긴 하였지만, 한 무리의 진달래처럼 처연하게 아름다웠다.
지금 조국의 현실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결단을 요구한다.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잔인한 고문과 탄압에 신음하면서도 끈질기게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경의하고 있을 수많은 동포들과 지금 멀리 조국을 떠나있는 우리는 긴박한 조국의 현실에 의해 하나로 묶여있다...광주시민은 죽었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의롭게 싸우다 용감히 죽어갔고 이제 우리에겐 그들의 정의로운 죽음과 희생의 뜻을 우리의 삶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꽃피우는 길만이 남아있다. (1980.6.3 튀빙겐대학교 한인학생회 명의의 <우리의 결의> 일부)
‘정의로운 죽음과 희생의 뜻을 우리의 삶속에 뿌리내리고 꽃피우는’ 그 길을 따라 나도 나섰을 것이다. 해마다 5월이 되면 한인유학생들이 있는 지역을 다니며 유학생들과 교민들에게 광주에서의 실상을 알리는 독일 공영방송인 ARD, ZDF 등을 편집한 비디오를 상영하고 토론회를 열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이며, 광주항쟁 체험기인 『찢어진 깃폭』을 복사하고 번역하여 뿌리고, 도미야마 다에코와 홍성담의 판화전에서 독일인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지대에 머무는 자로서의 죄책감을 탕감하고자 미소한 일들을 하며 결기의 날을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83년이었던가, 일시귀국 했던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할머니의 묘소가 아니라 살아서 안 적이 없던 이들이 누워있던 광주의 망월동이었다. 그렇다. 그 시대엔 나뿐 아니라 누구나가 그런 채무의식을 지니고, 때론 조국의 현대사에 가위눌린 채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야 했던 것이다.
박정희 없이 전두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고, 전두환 없이 ‘광주’가 있을 수 없으며, 광주 없이 유월항쟁이 존재할 수 없다. 유월항쟁 없이 국민의 정부가 존재할 수 없듯이, 노무현 정부는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다. 성공이든 실패든, 교사든 반면교사든,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이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한참을 가다보니 다시 제자리걸음을 걷는 듯한 착시현상도 종종 있는 것이다. 하루키의 표현을 차용한다면 세월은 톱니바퀴처럼 앞으로만 나아가지만, 역사는 때론 뒷걸음질도 치고 잊고 싶은 과거를 반복하기도 하면서 조금씩만 진전한다. 중요한 것은 ‘진전한다’는 믿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