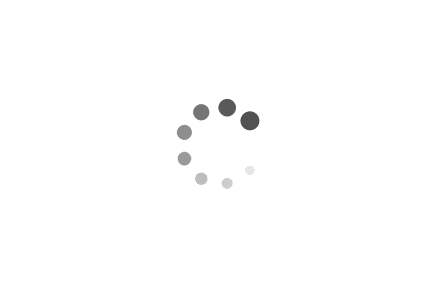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명동에는 명동성당이 있다
어떤 시인은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한다.’고 노래했다. 그런데 잔잔히 초여름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퇴직한 은행원 박씨는 압구정동이 아니라 문득 명동에 가고 싶어진다.
왜 그럴까? 명동에는 명동성당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직 젊었던 날, 그의 추억이 있기 때문이다. 추억? 그래, 추억이라고 말해 놓고 보니 괜히 쑥스러워진다. 하지만 지난 것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모두가 추억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곳에선 눈물 나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추억... 최루탄 연기 냄새 자욱한 추억...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의 인자한 모습을 비롯하여 아름다웠던 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
마악 넝쿨장미가 꽃을 환히 피우기 시작하는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초 언저리. 정확히 말하자면 1987년 6월 10일, 6.10국민대회가 열렸던 날이었다. 그날 많은 시민들이 물밀듯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에 맞서 군사정권은 수많은 전투경찰과 가스차를 동원해 ‘극렬분자’ ‘엄단’ ‘강력 저지’ 등의 극단적인 용어를 써가며 필사적으로 대회를 저지하고 있었다.
거리는 온통 최루탄 연기와 짱돌로 어지러웠다. 저녁 6시경에 시작된 서울 시위의 물결은 밤늦게 뿔뿔이 흩어졌고, 그래도 남은 사람들은 누가 먼저 가자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명동성당을 향해 모여들었다. 등불을 찾아 날아드는 나방들처럼...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험악하고 무서운 힘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기라도 한 것처럼...
사실이 그랬다. 그때 무자비한 경찰의 진압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서울 한복판 한 군데, 바로 명당성당 밖에는 없었다. 시위대가 성당으로 들어가자 뒤쫓아 온 경찰은 성당 안을 향해 무자비하게 최루탄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시위대는 성당 입구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꼬박 밤을 지새웠다.
경찰의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었다. 성당을 찾아 왔다가 엉겁결에 갇힌 신자들과 지나가던 시민들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최루가스 범벅이 되었다. 옷은 찢어지고 눈물 콧물 범벅에 비명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여차하면 경찰이 성당 안으로 강제 진입할 기세였다.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한 주임신부가 달려 나와 시위대의 마이크를 잡고 경찰을 향해 큰소리로 외쳤다.
“성당에 최루탄을 쏘는 것을 중단하라! 당신들이 성당에 이렇게 최루탄을 쏘는 것은 예수님께 총부리를 대는 것이나 다름없다. 책임자는 즉각 부대원들에게 최루탄 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라! 만일 계속 최루탄을 쏜다면 전두환 정권이 가톨릭교회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지금 선전포고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제들도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
거기에다 전날 "너희들이 성당을 짓밟으려거든 먼저 내 몸을 밟고 가라!"는 추상같은 추기경의 말씀이 있었다. 성당 난입과 강경 진압을 주장했던 경찰도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서 시위대 해산을 종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하여 잠시 동안 평화의 시간이 왔다. 성당 안의 시위대는 먼저 최루탄 가루와 짱돌로 어수선해진 성당 앞 길거리를 깨끗이 쓸고 물을 뿌렸다. 마침 그곳에서 오랫동안 천막살이를 하고 있던 상계동 철거민들이 시위 학생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위해 자리도 만들어주었다. 처음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나가자 조금씩 성당 부근의 공기도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다.
마침 그때 박씨가 근무하던 은행 지점도 그 부근에 있었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었던 은행원 박씨는 어릴 적부터 소심한데다 겁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시사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에는 아예 담을 쌓고 사는 편이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못마땅한 점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최루탄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좀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스러울 정도로 달랐다. 박씨만 달랐던 게 아니었다. 성당 부근에 살던 상인들도 달랐고, 성당 부근을 지나가는 행인들도 달랐다.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거나 연설을 하면 박수를 보내고, 애국가가 나오면 따라 부르고, 아리랑이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성당 안에서 농성하는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었고, 남대문시장에서 장사 하는 상인들은 단체로 돈을 모아 꼬깃꼬깃 접어서 정성스런 글씨를 써서 함께 보냈다.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진정 우리들의 희망"이라고...
성당과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던 계성여고의 학생들도 점심때면 도시락을 거두어 아기자기한 사연과 함께 전달하였다. 도시락을 먹은 청년들은 도시락을 깨끗이 씻어 쪽지와 함께 되돌려주었다. 그러면 다음 날 다시 도시락과 함께 쪽지가 왔다.
"언니, 오빠들에게 보냅니다. 꼭 보고 싶은 언니, 오빠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다. 김밥, 마스크, 담배, 심지어는 생리대까지... 성당안의 시위대가 필요하다 싶으면 어디서 보내왔는지 모르는 음식과 물품들이 모여 들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땐 참 이상한 세상이었다. 모두가 하나였고 모두가 사랑이었다. 그때 명동성당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의 전당이었고 해방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