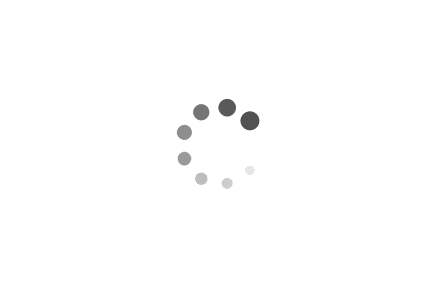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사상의 불을 지폈던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윤경아, 조심해!”
“응. 형도!”
“연락할 거 있음, 서점 메모판에 쪽지 남겨 둬.”
“알았어!”
윤경과 헤어진 광호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녹두 사거리를 빠르게 빠져나온 광호는 곧 버스에 올랐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 서점 메모판에는 각종 연락 사항들이 적힌 쪽지들이 빈틈없이 붙어 있었다.
등에 멘 백팩이 제법 묵직하였다. 오늘 후배들과 하는 세미나에 필요한 『전태일 평전』과 『철학 에세이』 세 권씩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세 권 값만 계산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주기로 했다.
사람 좋은 책방 주인아저씨는 가난한 그들에게 친구이자 형이자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이자 눈 밝은 선생이기도 했다. 서점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서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단지 장사로만 생각한다면 늘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어떤 사명감이랄까 함께 하는 보람이랄까 하는 게 없었다면 일찌감치 때려치우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사람 좋은 책방 주인아저씨는 오랜 세월이 지나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당시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글을 쓰는 일이고, 하나는 책을 펴내는 출판사를 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가에 인문사회과학 책방을 여는 것이었다.”
그의 말대로 대학가 인문사회과학 책방 주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우선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고 좋은 책을 선별해 권할 수 있는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가 필요했다.
김수영과 신동엽을 말할 수 있어야 했고 『공산당선언』이 마르크스가 1848년에 쓴 책이라는 것쯤은 알아야 했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누군지, 동학농민전쟁의 접주 김개남이 누군지 정도는 알아야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곳은 그냥 동네 서점이 아니었다.
광호와 같이 시대에 대한 고민과 지적 갈증에 목말라하는 청춘들의 사랑방이자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사상의 불을 지피는 뜨거운 현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불온한 책으로 찍힌 금서와 절판 도서를 만날 수 있었다. 규모는 작았지만 그 작은 공간에 담긴 책들과 책에 담겨 있는 지식의 크기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다.
대형서점의 줄을 세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고뇌에 찬 저자의 책, 그들만의 가치를 지닌 색깔 있는 책이 사방 천정까지 빼곡히 차 있었다. 오래된 석유난로 위에는 또한 오래되어 찌그러진 양철 주전자가 있었다.
당시 갈 곳 없는 청춘에게 그곳이 대학시절 내내 하숙집보다 더 친근한 공간이었던 셈이다. 때때로 외로울 땐 한참 더 나이 많은 주인장 ‘형’이 술도 사주고, 고민도 들어주곤 했다.
그래서 그 ‘형’이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었다.
1987년 4월 어느 무렵이었다. 서울 대학가 소재 인문사회과학 서점에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성균관대 앞 '풀무질', 고려대 앞 '장백서원', 서울대 앞 '그날이 오면' 등 세 군데 책방 주인을 연행해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고 갔다. 죄명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판매죄’라고 했다. 『전태일 평전』, 『철학 에세이』, 《월간 말》 등이 대표적으로 꼽혔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그날 광호는 윤경이랑 책방에 드나들던 다른 친구들 200여 명과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까지 달려가서 그들의 석방을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광호는 목이 터지도록 외쳤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까지 흘렸다. ‘책방 아저씨’들도 즉각 항의하였다.
“이런 책들은 큰 서점에서도 모두 판매하고 있는데 그들은 왜 조사하지 않나요?”
그러자 기막힌 대답이 돌아왔다.
“그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려고 책을 파는 것이고, 당신네들은 불온한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그러고는 마치 위해주듯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여기서 나가면 돈 안 되는 인문사회과학 서점 따위는 그만두고, 돈 되는 건전한 거 좀 해 봐.”
그들은 끝내 구속되어 한 달간 구치소 생활을 했다. 거창한 죄목에 비하자면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이었던 셈이다. 말하자면 그들을 겁박하여 대학생, 청년들이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막으려는 다분한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주인장 ‘형’이 출소하던 날, 광호와 친구들은 그를 위해 작은 술자리를 열어주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씩씩하였고 굴함이 없었다.
“아, 내가 돈 생각했다면 진작에 때려치웠어야 했겠지. 아내에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나한텐 그래도 이 시대에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 무엇보다도 너희들 같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 이렇게 막걸리 한잔 같이 기울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러고 나서 헛헛한 웃음을 날렸다.
광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그 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청춘들의 사랑방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의 바람은 어쩔 수 없었던가.
얼마 전, 그 서점에 들렀을 때 주인장도 이제 중늙은이 티가 났다. 그리고 더 이상 유지할 힘이 없다고 했다. 양철 주전자 대신 포트에서 물을 끓여 책 더미 한쪽 작은 탁자에 커피잔을 놓고 마주 앉았다.
“시대의 소명이 끝나가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에 문득 쓸쓸한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 지독했던 군부독재가 끝나고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서 대학생의 관심도 많이 달라졌어. 그런 사회 변혁을 갈망하는 책보다는 여행이나 자기 취미, 그리고 환경이나 페미니즘 같은 쪽으로 옮겨져 간 것 같아. 어쩌면 그런 다양성이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었는지도 몰라. 거기다 요즘은 책 대신 볼 게 얼마나 많아?”
그는 스스로 위로하듯이 말했다. 광호의 귀에는 그의 말이 엄청난 역설처럼 들렸다.
“참. 그나저나 윤경이는 잘 있어?”
주인장 형이 갑자기 생각나듯 말머리를 돌렸다.
“아, 예.”
광호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웃었다.
“애가 벌써 둘인걸요.”
“하하, 벌써 그렇게 되었나? 서점에 드나들던 학창 시절 그때 그 모습이 생각나네. 단발머리에 청바지 차림. 귀여웠지.”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뵙는다는 것이...”
광호는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변명처럼 얼버무렸다.
“하하. 됐어. 한창 바쁠 때지. 바쁜 게 좋아. 그래도 시간 되면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 와. 나는 늘 여기에 있으니까.”
그는 마치 집안 어른처럼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잠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 뜨거웠던 시절, 너희들이랑 책과 함께 해서 행복했어.”
‘저도요...’
하지만 강호는 그 말을 그냥 삼키고 묵묵히 찻잔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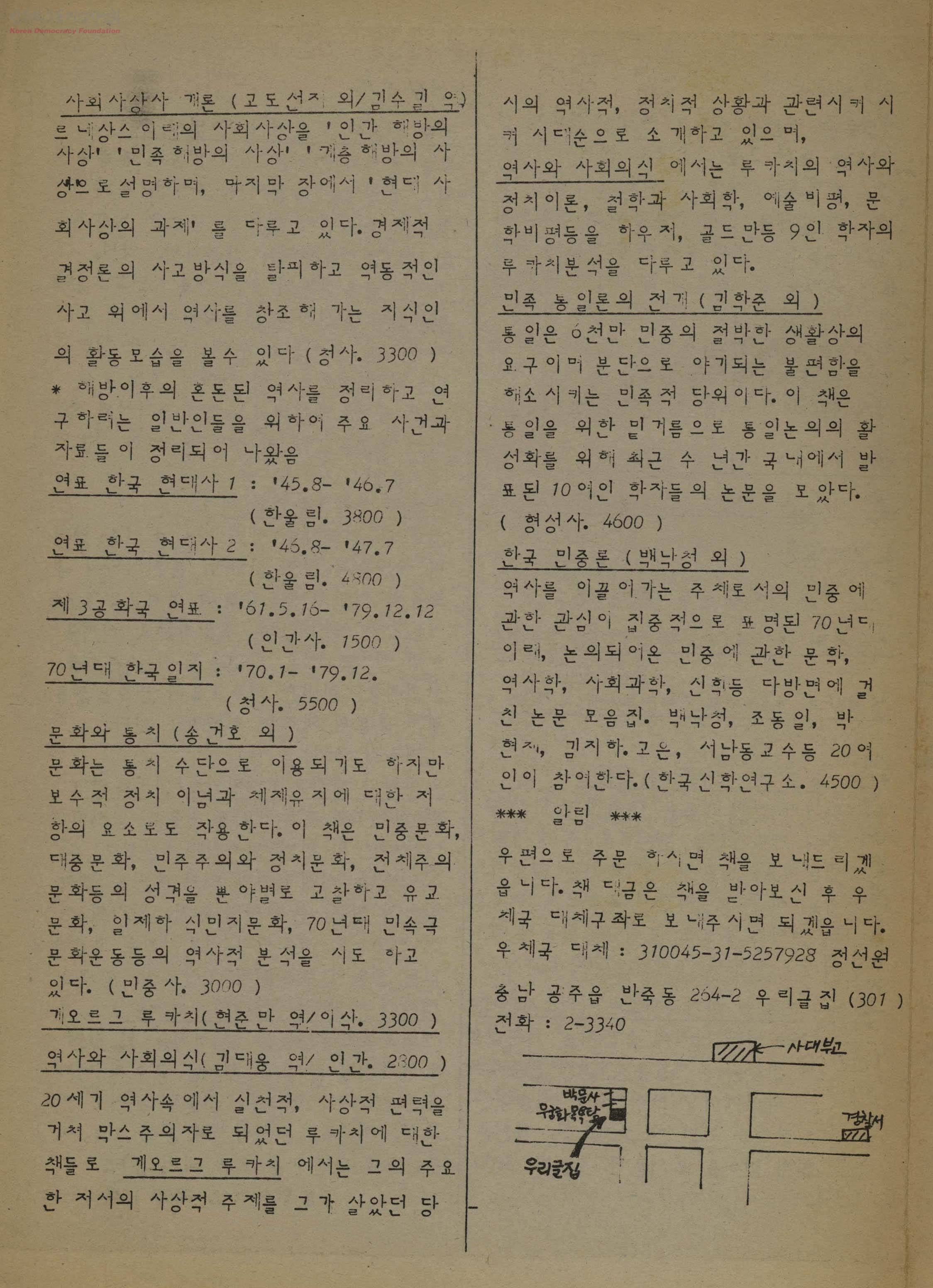


![성명서[인문.사회과학서점 불법수색 및 연행에 항의]](https://archives.kdemo.or.kr/file-img/vol01/008/366/00836684/00836684_0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