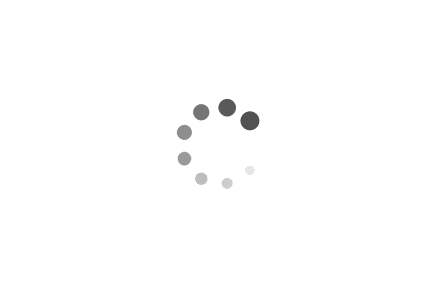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금지곡 이야기 - 내 청춘의 30일
이것 참, 어느 영화에 나오는 통속적인 유행어 같아서 좀 쑥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말하고 싶거든요. 아니, 목청껏 고함이라도 치고 싶습니다.
“내 청춘의 한 달을 돌려줘!”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고요? 내후년이면 정년퇴직할 나이에 청춘시절이라면 유신시절밖에 더 있겠습니까. 장장 18년이나 장기집권을 하면서 온갖 폭력을 저질렀으니 내게 한 짓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결코 그들의 행위를 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성인의 일 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는 열아홉 살 청년의 소중한 한 달을 빼앗아간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인터넷도 게임도 없던 1970년대 후반의 젊은이들에게 주어진 놀이라고는 통기타 치며 노래 부르기나 당구밖에 없었지요. 방학 때 바닷가로 캠핑을 가는 것과 함께요. 그해 나는 재수생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간 친구 몇 명과 강릉 경포대에서 캠핑을 하고 삼등 완행열차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 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
예, 송창식의 ‘고래사냥’이죠. 이장희의 ‘그건 너’, 김추자의 ‘거짓말이야’와 함께 당대 젊은이들의 최고 애창곡 아닙니까. 흡연을 하도록 좌석마다 재떨이가 달려있던 시절이지요. 기타를 조금 칠 줄 알던 나는 몇 잔의 소주에 취해 담배를 피워 문 채 열심히 송창식의 노래들을 불러댔습니다. 승객의 대다수는 동해바다로 놀러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라 우리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노래판이 벌어져 있었죠.
“너희들 일어나봐! 신분증 내놔!”
서너 명의 열차 공안들이 몰려온 것은 내가 한창 커다란 목청을 뽐낼 때였습니다. 공안이라면 요즘 청년들은 모르는 단어겠네요. 경찰은 아니고 일종의 기차 경비원이라고 할까요? 경찰이든 경비원이든 제복 입은 사람이면 겁부터 먹기 마련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신분증을 내밀었죠.
“명문대 다니네? 지성인이 이러면 되겠어?”
공안들은 대학생 친구들의 학생증을 보고는 뒤통수나 한 대씩 때리고 말더군요. 그런데 주민등록증밖에 내놓을 게 없는 내게 오더니 태도가 확 달라지대요.
“뭐야, 너 재수생이야? 네가 기타 쳤지?”
나 혼자만 공안의 손아귀에 뒷덜미가 잡혀 끌려가게 됐습니다. 홍익회 상품들을 쌓아두느라 여유가 있는 칸으로 끌려가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라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박정희 시대는 그런 시대였답니다. 정식 경찰도 아니고 기차 경비원에 불과한 공안도 위세가 등등한 시대였지요.
어찌나 무릎이 아프던지, 청량리역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인계되니 살 것 같더군요. 난생 처음 수갑에 채워져 역전파출소로 끌려가는데 한여름 땡볕이 내려쬐는 역전광장에서는 마침 장발단속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귀를 가리거나 목덜미를 덮으면 무조건 가위로 듬성듬성 잘라버리는 거죠.
“야! 거기 장발! 이리와 앉아!”
고성방가야 타인을 불편하게하고 한다지만, 머리카락 좀 긴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런데도 누구 하나 따지지를 못하고 경찰이 손가락만 까닥하면 군말 없이 걸어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항의해 봤자 몽둥이찜질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요. 청년들이 앉았던 의자 아래에는 온종일 잘려 나온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에어컨이 귀하던 시절이었죠. 선풍기 바람마저도 뜨거운 파출소에서 간단히 조사를 받고 청량리경찰서 즉심대기실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데모 하나 없던 시절인데도 무슨 죄수가 그리 많은지, 초저녁부터 꽉 차 있더군요. 입을 다물고 정좌하고 있어야 하지만 서로 속삭이기는 했어요.
“고성방가? 한 일주일 살겠군.”
경험 많은 옆 자리의 술꾼 아저씨 속삭임에 나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어딘가에 강제로 갇힌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무리 사소한 일로 잡혀도 자살충동까지 느낄 수 있다는 걸 미처 알지 못했던 때이니까요.
밤 열시 쯤 되었을 겁니다. 줄줄이 끌려 나가 즉심 담당 판사 앞에 서게 됐지요. 앞의 사람들이 길어야 열흘 정도 구류를 받거나 훈방되기에 나는 마음씨 좋은 판사를 만났구나 싶었죠.
“노래는 어떤 걸 불렀나?”
판사의 질문에 무심코 답했습니다.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불렀는데요?” 판사는 무언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다른 노래는 또 뭘 불렀냐고 묻더군요. 나는 역시 대수롭지 않게 답했지요. 송창식의 ‘왜 불러’와 ‘한번쯤’을 불렀고 이장희의 ‘그건 너’도 불렀다고요. 판사는 근엄한 표정으로 나를 내려다보며 훈계를 하더군요. 영화에서나 판사들이 훈계를 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잔소리까지 하시더군요.
“송창식이의 ‘한번쯤’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금지곡들이구만. 사회에 무슨 불만이 그리 많아서 금지곡들만 부른 건가?”
돌발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니 판사는 기록과 나를 번갈아 보며 말하더군요.
“네가 부른 ‘고래사냥’은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퇴폐적인 가사라 금지됐고, ‘그건 너’는 남의 탓만 하는 비주체적 사고방식을 부추기기 때문에 금지됐는데? ‘왜 불러’는 반항심을 조장하기 때문이고. 이런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아마 판사가 웃으며 말했다면 농담인 줄로 알았을 겁니다. 아니, 나는 반쯤은 농담으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나는 약간 애매한 미소를 띤 채 되물었죠. “그런데, 송창식의 ‘한번쯤’은 왜 금지가 안 된 거죠?”
순간, 판사의 눈빛에 냉기가 서리더군요. 실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로 바뀌는 순간이자, 내가 ‘멍청한 녀석’에서 ‘악질적인 상습범’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판사는 더 말도 안 붙이고 나무방망이를 두드리더군요.
“구류 삼십 일!”
어안이 벙벙합디다. 도둑놈, 사기꾼, 폭력배, 소매치기, 강간범, 방화범들이 우글거리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한 달이라니! 하루 종일 철창 앞에 정좌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데다 근무경찰이 바뀔 때마다 철창에 매달리기니 머리박기 같은 기합에 동작 느리다고 두들겨 맞고, 같은 칸의 폭력사범들에게 두들겨 맞고… 아, 그 끔찍한 이야기는 생략합시다. 한 달 꼬박 꽁보리밥에 시커먼 무절임밖에 없는 관밥을 먹고 나와서야 나는 얼마나 많은 노래들이 금지되었던 것인지 알게 됩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는 정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되었고, 이금희의 ‘키다리 미스터김’은 박정희의 작은 키를 비꼬는 것으로 보아 금지됩니다. 한대수의 ‘행복의 나라’는 매우 건전한 가사임에도 지금 이 사회가 불행하니까 행복의 나라로 가자는 것이냐며 불온하다고 금지시켰죠. 한대수의 ‘물 좀 주소’는 중앙정보부의 물고문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더군요.
이렇게 수백 곡의 인기가요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건전가요라는 게 생겨나 의무적으로 방송되고 모든 음반의 맨 뒤에 실려 엄청난 돈을 벌었다죠. 나는 그놈의 건전가요란 건 불러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게 건전가요였는가는 생각나지도 않아요. ‘아 대한민국’이니 ‘예비군가’ 같은 게 실린 것도 같은데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지긋지긋하네요! 진짜 잊고 싶어요.
네? 그 뒤로 어찌 살았냐고요? 하루가 아쉬운 재수생이 한 달이나 갇혀 있었지, 석방되고서도 한동안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대학을 포기하고 떠돌다가 뒤늦게 철도청에 취직을 했답니다. 하필이면 철도공무원이 된 거죠. 공안들에게 당한 복수라도 하듯, 철도기관사가 되어 마음껏 혼자 노래를 부르며 열차를 몰아온 지 벌써 삼십 년이 되가네요.
인생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긴 시간동안 노조집행부가 되어 파업도 주도하고 거리의 민주화시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왜냐고요?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자유, 머리를 기를 자유, 부당한 폭력에 거부할 자유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세상을 만들려고요.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얼마 전에 그때 그 친구들과의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한 달 간 구류를 살았었다고 고백했답니다. 가난한 우리 집에는 전화가 없다보니 아무도 그 일을 몰랐고, 나도 창피해서 사십 년이 다 되도록 말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한 달이나 살았다고? 우린 그냥 며칠 갔다 온 줄 알았어. 니가 혼자 뒤집어썼구나? 정말 미안하다야, 면회도 안 가고. 자, 한 잔 해라!”
깜짝 놀란 친구들의 위로에 어쩐지 눈물이 찔끔 났답니다. 근 사십 년 동안 명치를 누르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