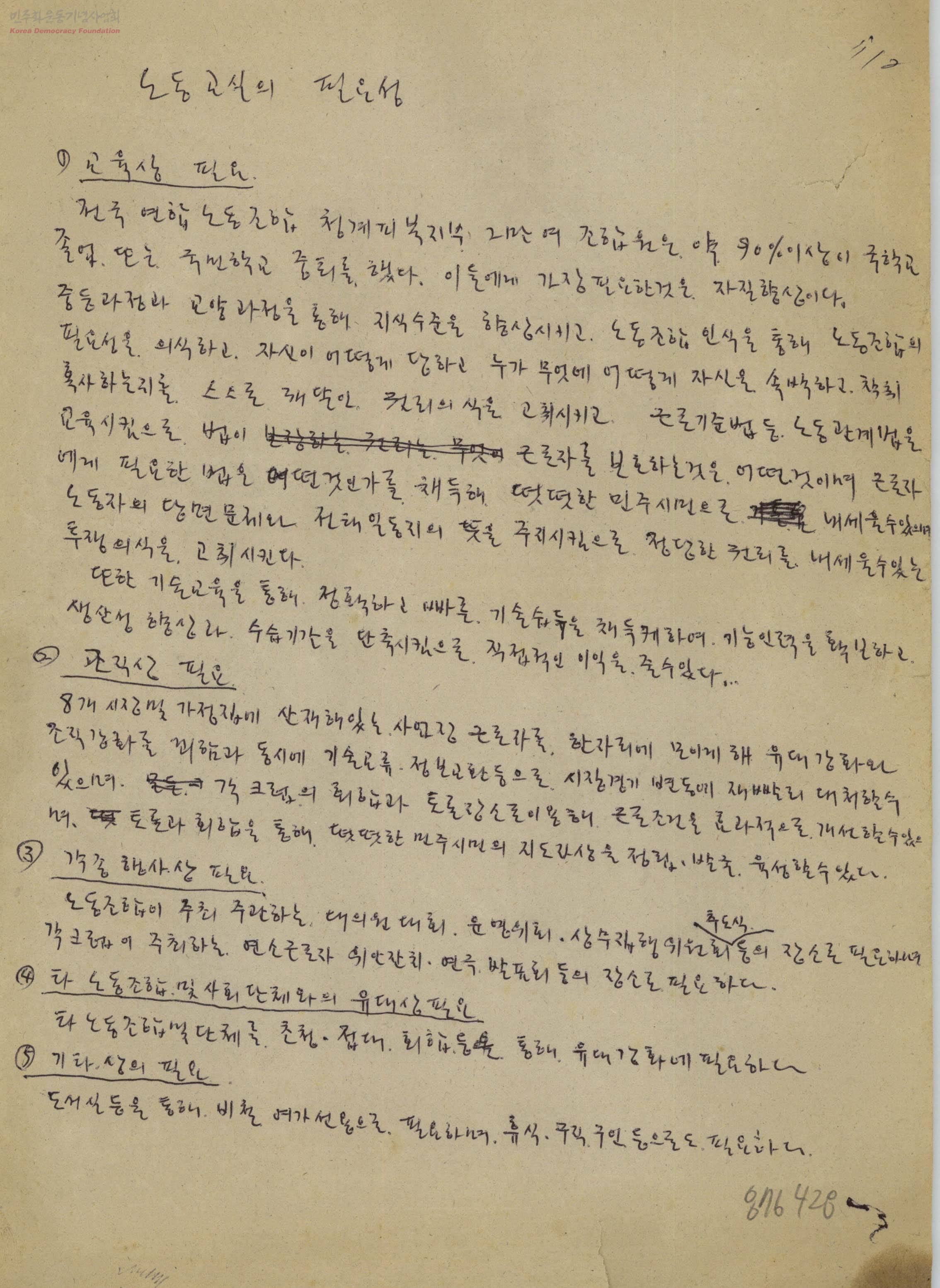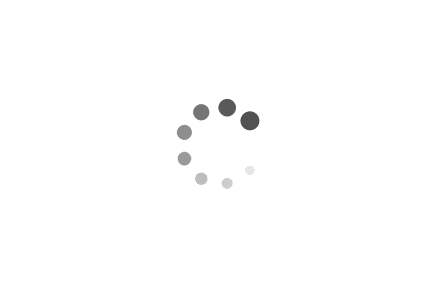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열세살 시다 - 신순애 이야기
열세 살 시다
1966년 봄 중랑천 변, 방 한 칸에 8명이 살고 있었다. 서울로 가면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온 식구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참이었다. 먼저 올라온 큰 오빠 내외가 빌린 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작은 오빠, 언니, 조카, 순애 이렇게 살았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 땅 한 평 갖지 못한 농민이 서울에서 잡은 첫 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순애는 초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하고 서울로 와서 ‘콩나물 값이라도 벌만한’ 일자리를 찾아 여기 저기 기웃거렸다.
어느 날, 옆 집 사는 언니가 평화시장에 가자고 했고 그 손에 이끌려 화려한 옷이 잔뜩 걸린 복잡한 지하도를 건너서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건물로 들어갔다. 그 건물은 굉장히 길었고, 작은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나 요란해서 어린 순애의 정신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다.
“길이 얼마나 복잡했던지, 나중에 집에 못 찾아갈까봐 덜컥 겁이 났다.”고 신순애는 당시를 기억했다. 무척이나 길었던 그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을 하여 말끔해졌지만, 화장실이 건물 양쪽 두 군데 밖에 없는 것은 여전하다고 했다. 수많은 여공들이 복도 양쪽에 달린 화장실에 가기 위해 뛰어다녔던 기억, 사람에 비해 화장실이 턱도 없이 부족하여 늘 줄을 서야 했던 기억, 그래서 물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신순애. 열세 살 나이에 평화시장 시다가 되어 꼬박 15년 세월을 평화시장과 함께 살았다. 새벽부터 나와 버스 막차 시간인 밤 11시 20분까지 미싱을 돌렸고 3년 만에 미싱 보조가 되고, 그 후 미싱사가 되었지만, 하루 종일 구부리고 앉아서 일만 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틈이 없었다.
“전태일이 분신했던 그 날도 저는 미싱을 돌리고 있었어요. 사장이 그러더군요. 저기 청계천 어디서 깡패 하나가 죽었는데, 행여 구경한다고 나가지 말라고. 저는 그 소리 듣고 그런가보다 했어요. 진짜 구경도 안 나가고 일만 했으니까요.”
‘깡패’ 전태일
신순애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전태일, 아니 1970년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전태일. 그의 죽음 바로 곁에 있었던 미싱사 신순애는 정작 그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 후 검정고시 준비를 무료로 시켜준다는 말에 노동교실에 등록했고, 그제서야 그 노동교실이 바로 전태일의 죽음 덕분에 생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삶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당시 노동교실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다. 장명국, 신인령 등 뜻있는 지식인들이 자처해서 노동자들의 벗이 되었고 그 속에서 신순애는 세상을 다시 배웠다. 새벽부터 밤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미싱을 돌리는 일이, 그렇게 많이 일해도 점심을 굶어야 할 정도로 임금이 적다는 것이, 퇴직금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가짜 쌀가마
신순애는 평화시장 옥상에서 13일간 계속되었던 농성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 때 농성을 벌인 주요 이슈는 퇴직금 문제였는데,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이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미리 옥상에다가 쌀을 한 스무 가마 쌓아 두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버틸 준비를 다 했다는 걸 보여 주려고. 그 때는 경찰들이 헬리콥터로 옥상 위를 촬영했거든요.”
그러나 이 쌀가마니에는 비밀이 있었다. 거기에는 쌀이 없었던 것이다. 공장에서 나오는 기레빠시(천 조각)를 잔뜩 가져다가 가마니 안에 넣어 쌀가마니처럼 보이게 만들고 퇴직금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쌀은 얼마 되지 않았다. 어쨌든 쌀가마니 옆에 커다란 가마솥 두 개를 걸고 매일 밥을 지어 5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주먹밥을 만드는 일은 그 때 고작 스물 두어 살 먹었던 순애의 몫이었다.
“그전에 그렇게 많은 밥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되더라고요. 반찬이 어딨어요? 참기름 약간에 소금만 쳐서, 단무지 하나만 가지고 십삼 일을 버텼어요.”
8시 퇴근의 기억
평화시장의 노동자들은 퇴근 시간이 각기 달랐다. 평화시장에서 가까운 창신동이나 신당동에 사는 사람은 밤 열한 시 사십 분까지 일을 했고, 이문동이나 중랑교에 사는 사람은 열한 시 이십 분쯤 회사를 나섰다. 평화시장 앞에 막차가 서는 시간이 바로 그들의 퇴근시간이었던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문제야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당시 신순애와 동료들에게는 노동교실에 갈 시간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우리도 제 시간에 퇴근하자. 지금은 노동교실에 오고 싶어도 못 온다.’ 노동교실에 모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신순애의 기억에 그 농성은 길지 않았던 것으로 남아있다. 삼십 여명의 노동자가 하루나 이틀 정도 밤샘 농성을 했었고, 경찰이 와서 무섭게 농성자들을 다그쳤지만, 결국 밤 8시 전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의를 했다. 그러나 그 짧았던 농성이 끼친 영향은 참으로 컸다.
“진짜 7시가 되니까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불을 다 끌 거니까 얼른 퇴근하라고. 세상에, 불 꺼진 평화시장 건물을 더듬더듬 하며 밖으로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정시에 퇴근을 하는구나, 이게 정말 가능 하구나 … ”
신순애는 ‘사람들이 다니는 시간’에 퇴근하면서 느낀 감격을 ‘승리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단결해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이 경험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가져다주었고, 그것은 가난한 소녀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한 일이었다.
노동자들의 방식 -특별한 한글 교육
1980년 5월 청계노조가 폐쇄되고 신순애는 합수부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그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을 쓸 줄 모른다.’고 버텼다. 조서를 쓰지 않기 위한 나름의 방편이었다. 결국 그녀는 풀려났고,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잘한 일이었다고 그녀는 술회했다.
그런데 ‘한글도 모르는 무식한 것’ 행세를 하던 그녀에게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평화시장의 어린 노동자들이 좋은 대학에 다니던 대학생 선생님들을 다 제치고 그녀에게 글자를 가르쳐달라는특별한 부탁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 영어 알파벳 M과 W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회사에서 옷에 미디움 사이즈 라벨 M을 붙일 때 종종 W로 붙이는 바람에 욕을 먹고 옷을 망친다는 이다. 그게 그거 같으니 구별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신순애는 평화시장 노동자들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글자 수업을 시작했다.
ㄱ, ㄴ, 으로 시작하거나 가방, 나비로 시작하는 한글 교재들을 다 제쳐두고 회사 이름 쓰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매일 보는 회사 이름, 예를 들면 다림사, 문화사, 행복사 같은 이름말이다. 눈에 익은 글자인데다 뒤에 붙는 00사는 같아 결국 두 글자만 익히면 되니, 다들 쉽게 배웠다. 그 다음에는 자기 동네 이름을 쓰게 했다. 버스 탈 때 마다 매일 보는 글자이니 이미 모양이 눈에 익어 그것도 쉽게 배웠다. 창신동의 골방에서, 서로 발을 맞대고 앉아야 할 정도로 좁았던 그 방에서 평화시장의 시다 후배들은 그렇게 배움을 이어갔다.
아! 청계노조
신순애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절,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직도 못하고 2년 동안 열여덟 번이나 이사를 하고 ‘빨갱이 가족’이 되어 오빠들도 해고당했던 그 시절, 청계노조에 있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그 대학생이 당하는 고통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할 때는, 세상에 알리지도 못했던 여자 동료 이야기가 생각나서 마음이 더없이 복잡했다. 충격과 공포를 혼자 감당해야 했던 평화시장의 그 노동자는 결국 세상 밖으로 숨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그때 그녀의 일도 세상에 알려야 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종종 신순애는 그 일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청계노조는 영원한 고향이었다. 자신을 당당한 인간으로 살게 해준 곳, 새롭게 태어나게 한 곳이었다. 그녀가 오늘 청계노조의 나날들을 애써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고마운 고향에 대한 그녀 나름의 감사 인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