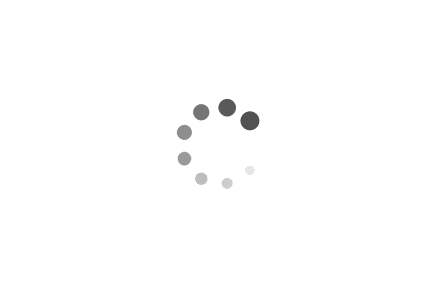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사진으로 남긴 투쟁의 기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용수 선생의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사진필름이 사업회에 기탁되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 기록에서 박용수 선생의 사진이 가지는 의미는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다. 선생이 민주화운동 투쟁현장을 뛰어다니며 찍은 사진에는 민주화운동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 용솟음치는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 있다.
민주화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1980년에는 수많은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박용수 선생은 젊은이들도 일일이 참여하기 힘들만큼 많았던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어김없이 나타나곤 했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 현장에는 50대의 나이에 무거운 사진기를 둘러맨 그가 늘 있었다.
사진은 정직하다고 한다. 그러나 사진에서 피사체의 각도와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어느 순간을 포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여기에는 사진을 찍는 이의 관점과 세계관이 카메라 뒤에 존재하는 렌즈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박용수 선생이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한 것은 민주화운동 기록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기이자 큰 행운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단지 관제언론과 경찰이 찍은 사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박용수 선생 자신의 삶과 그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긴 사진이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민주화운동의 투쟁기록이 사진으로 남게 된 것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량을 총결집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탄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글학자이자 시인이기도 한 박용수 선생이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누비며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민통련이 만들어진 때부터였다. 1970년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회원으로 민주화운동과 연을 맺었던 선생은 민통련 보도실장을 맡아 서울 뿐 아니라 전국의 집회 현장을 뛰어다니며 셔터를 눌렀다.
자그마한 키에 마음 좋은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집회현장과 시위대열을 뚫고 정신없이 셔터를 누르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치면 어린아이 같이 환한 웃음을 웃곤 했지만 이내 사진에 열중하던 박용수 선생. 선생이 청소년 시절 장티푸스로 소리를 잃은 사실과 국내 유명한 사진관의 유능한 사진가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시인이요 최초의 작문용 사전인 <우리말 갈래사전>을 펴낸 한글학자이기도 하다.